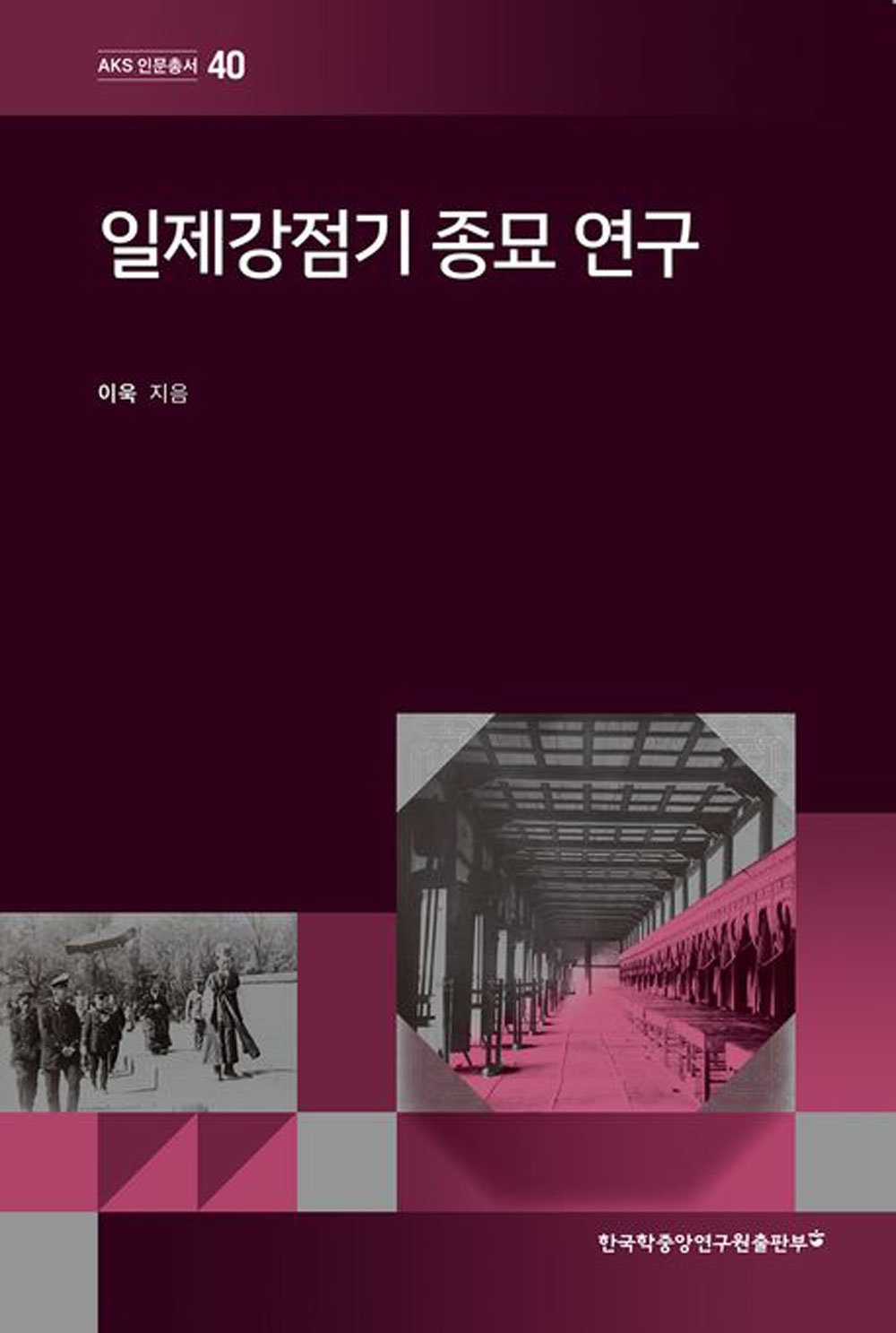
조선의 종묘 제사, 李왕가 집안제사로 축소
“효자태황제(孝子太皇帝)…황고문조(皇考文祖).” 순종 즉위 뒤 종묘사향대제(宗廟四享大祭)에 쓰인 축문에서 고종은 자신을 ‘태황제’로 칭했다. 하지만 일제강점 뒤엔 태황제라는 칭호 없이 자신을 그저 ‘효자’라고만 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면서 축식(祝式·제향 때 신이나 조상에게 올리는 축문의 형식)이 바뀐 것이다. 이욱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한 ‘일제강점기 종묘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사진)에서 일제강점기 종묘가 식민 권력 아래서 어떻게 바뀌고 존속했는지를 조명했다. 책에 따르면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며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천황제 체제 내의 왕공족(王公族)이 됐다. 순종은 ‘창덕궁 이왕’,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 됐고, 조선의 유교적 예법은 천황(일본 왕)제하의 식민지 행정 기구인 ‘이왕직(李王職·이왕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제)’의 사무규정으로 편입됐다. 왕실의 제사는 대부분 유지됐다. 하지만 고종뿐만 아니라 순종 사후